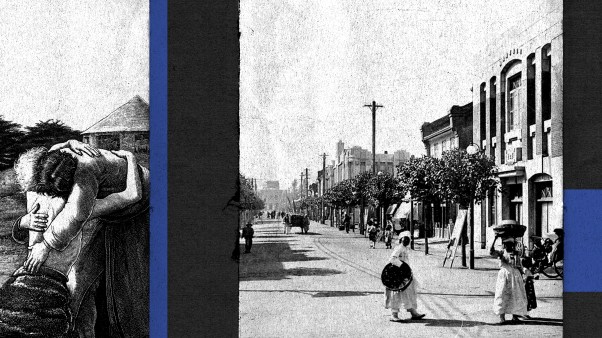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북한군 출신으로 나중에 목사가 된 김신조 씨가 지난 4월 9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향년 8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김신조 씨는 1968년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를 습격을 시도했던 북한 특수공작원 중 유일하게 남한에서 생포된 인물이다.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한국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씨는 1942년 해안 도시 청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5년 한국은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소련군이 북쪽을 점령했다. 1948년 북한은 독립 국가가 되었다. 같은 해 북한의 공산당 위원장이 된 김일성(고인과 친척관계 아님)은 공산주의 체제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파했고, 김신조 씨는 김일성 체제의 강력한 이념 교육 속에서 성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씨는 군에 복무했고, 이후 북한 정부는 그를 김일성의 측근들이 직접 지휘하는 엘리트 특수부대에 선발했다.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강제 통일하려는 계획을 세운 김일성 정권은 남한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부대를 훈련했다.
공격 계획 이틀 전인 1월 19일, 특수공작원들은 비무장지대를 지나 남측 지역에 침투하여 산에서 땔감을 찾던 네 명의 우 씨 형제와 우연히 마주쳤다. 군사 정책에 따라 민간인을 만나면 사살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고심 끝에 우씨 형제를 살려주기로 했다. 우 씨 형제는 즉시 경찰에 간첩 신고를 했고, 당국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이들의 경고 덕분에 결국 암살 시도는 무산되었다.
1월 21일, 김신조 씨와 동료 공작원 30명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준비하며 청와대로 접근했지만, 남한 군인들이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훗날 ‘1.21 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해 남한은 북한 공작원 29명을 사살하고 김 씨를 생포했다. 공작원 한 명은 북한으로 탈주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박 대통령의 목을 따러 왔다”고 말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간인을 향해 총은 한 발도 쏘지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러 온 것뿐이다.”
체포된 후 당국은 김 씨를 특별 보안 사건으로 분류해 철저한 감시를 실시했다. 결국 청와대 습격 당시 민간인을 해치지 않았고 북한 이념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판단한 후 그를 석방했다.
김 씨의 탈북 이후, 북한 정권은 연좌제에 따라 그의 가족을 북한에서 처형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돌렸다.
국가적 차원에서 1.21 사태는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가 안보 정책을 채택하고 청와대 주변 경비를 강화하며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반공 감정이 고조되었다.
1970년, 김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묻기 시작했다. 훗날 그가 자서전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1994)에서 회고했듯이, 이러한 실존적 질문은 그의 신앙 여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같은 해,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위로의 편지를 써준 최정화 씨와 결혼했다. 그녀의 헌신과 신앙은 그를 기독교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1981년 서울 성락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는 “나는 대통령을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했다.
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니었다. 북한에서 받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 교육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는 신앙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앙을 통해 속박된 삶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다.
1989년, 김 목사는 복음을 위해 탈북자 기독교 단체를 설립했다. 이 사역은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뿐 아니라 신앙 회복, 상담, 심리적 치유 등을 제공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인도했으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도 병행했다.
김 목사는 생전에 대한민국 전역을 돌며 국가 안보와 한국 통일에 관한 강연을 3,000회 이상 했다. 그의 강연은 복음 전도와 반공 교육, 북한 정권하에서의 삶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특히 청소년들과 군부대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공적 영역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과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 국회와 정당에 북한과 인권에 대해 조언했으며, 남북한 간의 대화가 진실과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도 김 씨의 개인적인 삶은 순조롭지 못했다. 1980년대부터 그는 익명으로 보내거나 혁명 구호가 적힌 협박 편지 등 북한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 중 일부는 그를 “남한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며 “처벌의 날이 올 것이다”고 협박했다.
청와대 습격 29주년이 되던 1997년 1월 21일, 김 목사는 목사안수를 받고 성락삼봉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후에 자신에게 세례를 준 교회인 성락교회에서도 사역했다.
노년에 김 목사는 글과 묵상에 집중했다. 자서전 외에도 ‘날지 않는 기러기‘라는 묵상집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을 “실패가 아니라 은혜로 인해” 멈춰버린 철새에 비유했다. “그러나 나는 멈춤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했다.
김 목사는 요양병원에서 두 달간 지낸 끝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그의 장례식을 방문한 조문객 중에는 1968년 암살 시도 전에 김 씨를 만났던 4명의 우 씨 형제 중 막내인 우성제 씨도 있었다. 우성제 씨는 “그를 통해 내가 살려준 목숨이 다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신조 목사의 유족으로는 아내 최정화와 아들과 딸이 있다.